잡동사니 속의 보석이랄까? 가끔 내버려져 있는 것들을 다시 보면 괜찮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 네이버에서 공짜로 받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삭제키를 누르려고 하다가 잠깐! '그래도 일단 보고 지우자.'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아주 괜찮은 영화입니다. 제목 때문에 아이가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영화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서 봤습니다.
주인공은 아이가 아닌 아내를 사별한 노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노인을 아이처럼 대하는 시스템에 주인공 다니엘의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을 목수로 살다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간 지원센터에서는 형식적인 행정 때문에 좌절하는 내용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난민
정보와 디지털 소외계층을 이 만큼 잘 표현한 영화도 없을 거 같습니다. 다니엘이 실업급여이든 질병 급여든 무엇이든가에 결국에는 인터넷과 컴퓨터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평생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다니엘로서는 대단한 장애물입니다. 이력서 작성과 복지 신청을 위해서 어려운 컴퓨터부터 배워야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봤지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오죽할까요 PC가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일부에는 여전히 어려운 대상으로 남아있고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해놓곤…못 쓰면 ‘소외계층’ 타박
n.news.naver.com/article/028/0002505593
어렵고 복잡하게 해놓곤…못 쓰면 ‘소외계층’ 타박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지 풀려고 티월드 들어가려니 로그인해야 하고, 로그인했더니 해외라고 다시 인증하라는데 정지된 휴대폰으로 어찌 인증하라고? 등록했던 이메일은 아마 옛날이라 핫��
n.news.naver.com
컴퓨터보다 더 답답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번번이 좌절을 안겨주는 관료적인 절차입니다. 영화 시작부터 무의미할 질문에 다니엘이 답을 하는 과정은 입에 고구마 한가득 물고 있는 것처럼 답답함입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저 복잡한 절차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원래 목적은 사람을 위함이었을 텐데...
다니엘의 이웃으로 등장하는 캐티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시간 안에 오지 않았다고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다니엘과 케이티는 언어는 통하나 대화가 되지 않는 시스템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프랑스인과 대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무력하게 도움만 바라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역시 처음 알게 된 감독 '켄 로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엔 의도적인 잔인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가난은 네 탓이다', '직업이 없는 것도 네 탓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은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나는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나는 한 명의 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소설이나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화를 인생의 어느 시간에 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더라면 관료적인 절차로 낭비되는 현실에 마냥 분노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역시 돈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받기도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되짚습니다. 네.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미 다들 현실에 부딪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아끼던 물건을 내다 파는 것, 배가 고파 기부받은 통조림을 허겁지겁 먹는 것, 놀림받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모두 돈이 참 문제입니다. 그놈의 돈. 돈 만 있다면 내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 텐데.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압니다. 극 중 등장하는 케이티의 딸 데이지가 하는 말 "우릴 도와주셨죠? 저도 돕고 싶어요"아마 "서로서로 도와요" ( 앗! 슈퍼 마리오 메이커)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겠죠. 영화가 주는 따뜻함이기도 하고 현실에서도 좋은 뉴스로 많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원, 즉 돈이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자유주의 비판에 마냥 동의하지 않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시각입니다.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소재에서는 항상 신자유주의가 그 배후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실체가 보이지도 않는 신자유주의만 깨부수면 모든 게 해피엔딩이 될까요? 그건 대마왕을 깨부수면 세상의 평화가 올 거라고 말해주는 판타지 영화(게임)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이 아닌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는 문제입니다. 세상 문제를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쉽게 나누는 버리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더군요. 누군가는 정말 악일 수도 있고 ( 왜냐면 악은 정말로 되기 쉬우므로 )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가 선일 가능성은 글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선은 아니고 그들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로봇으로 만들었을까?
영화를 반대편에서 보면 다른 시각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케이티와 다니엘을 상대하는 복지사들이 대상입니다. 그들은 영화 속에서는 마치 무표정에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 묘사됩니다. 알고리즘 마냥 정해진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는 로봇. 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나다. 아마도 그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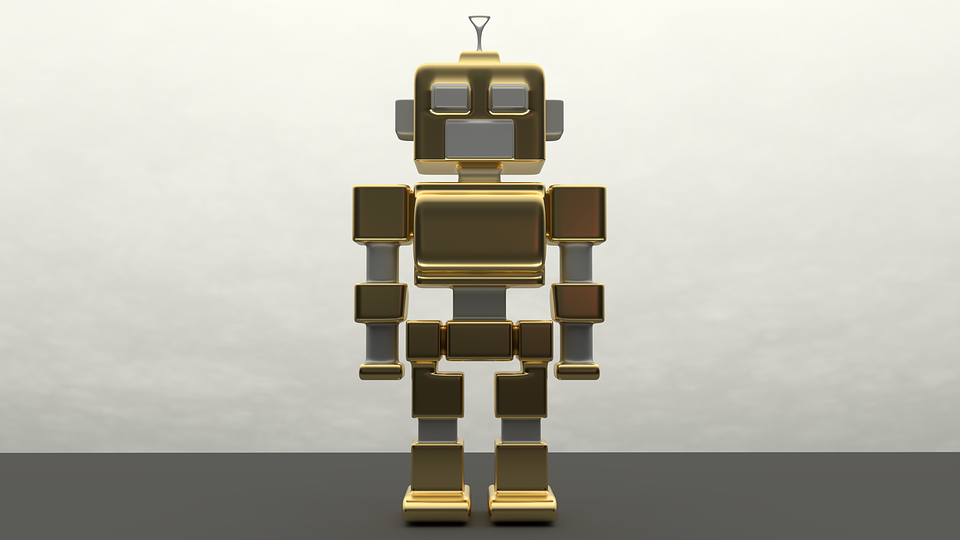
그들이 따르는 행 정철 차와 관료제 속에서 좌절했을 것이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점점 지쳐갔을 겁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성실일 수도, 인내, 노력일 수도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은 말라붙은 대지처럼 고갈되었고, 점점 무표정하게, 절차대로, 마침내는 인간이 아닌 로봇화 되었을 겁니다.
로봇이길 강요되는 삶. 은 또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영화와 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딥워터 호라이즌 : 막을 수 없는 건 재난 그리고 (0) | 2020.08.16 |
|---|---|
| 남산의 부장들 : 좋은 배우들의 캐리. 역사에 꽃길은 없는 법이지 (0) | 2020.01.30 |
| 보헤미안 랩소디 : 전사는 검을 쥐고 죽어야 한다 (0) | 2020.01.08 |